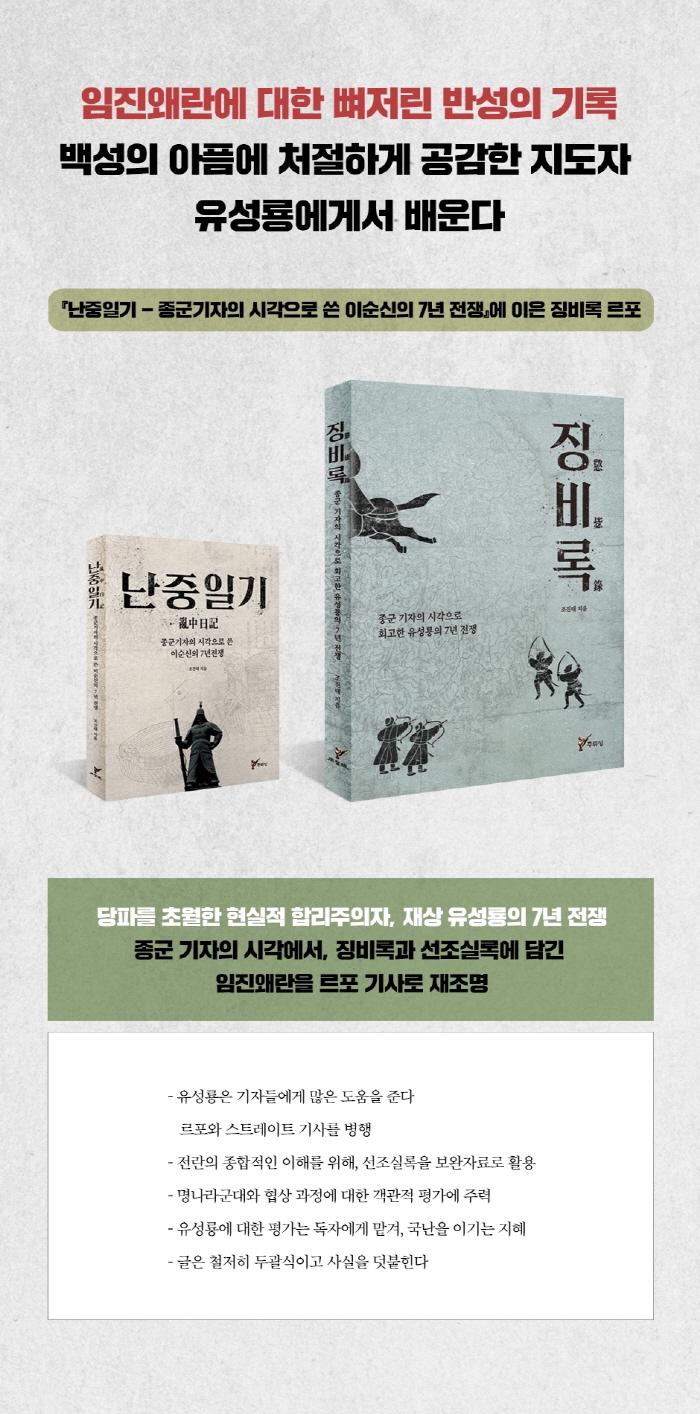인간은 개보다 어떻게 존엄한가?
인간은 개보다 어떻게 존엄한가?
개는 우리말에서 욕설의 대명사입니다. 애완견을 기르는 분들은 기분이 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애완견이라는 말도 그리 기분 좋은 단어는 아니지요. 애완견의 ‘완(玩)’은 완구처럼,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다는 뜻이 담겨 있으니까요. 반려견이라는 명칭으로 바뀌고 있는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질문은 어떨까요? ‘사람과 개’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하냐는 질문이요. 조금 당혹스러우실 수도 있습니다. ‘사람과 개’ 대신에, ‘사람과 닭’이라고 묻는다면 대답이 좀 더 쉬워질 것입니다. 치킨은 먹어야 되니까요. 다시 질문을 구체화하겠습니다.
“자동차가 달려오는 도로에 어린 아이와 강아지가 있고, 이 중 하나만 구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거의 모든 사람이 아이를 택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래야 되느냐?”고 물으면 쉽사리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아주 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정작 그 뻔한 이유는 생각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단지 인간이라서?’, 매우 썰렁한 답변이지만 이것도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미켈란젤로의 작품 천지창조에 따르면 인간은 분명 신의 모습을 닮아 있습니다. 인간, 즉 호모사피엔스(Homo sapiens)는 다른 동물 종과는 달리 신이 부여한 종적인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인간은 자연을 비롯해 다른 동물 종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신이 인간에게만 허락한 특권이지요.
천지창조[미켈란젤로]
하느님께서는 “우리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 또 집짐승과 모든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 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하시고, 당신의 모습대로 사람을 지어내셨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만이 이런 특권을 누릴 수 있다는 사고방식은 사실 그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인간이니까 공감할 뿐입니다. 이는 자칫 환경을 무작정 훼손하고, 동물을 마구 잡이로 포획하고, 바다를 식량 창고와 하수구로 사용한 죄책감을, 한 마리 강아지를 키우며 씻어내는 합리화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인간은 매일 매일 식탁에서 동물을 만나면서도, 이를 육질의 등급으로 파악할 뿐, 도축장에서 죽어가는 동물의 모습은 거의 연상하지 못합니다. 한 여인의 밍크 코트에 대한 집착은 수백 개체의 밍크 가족을 파탄시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인간과 동물이 동등하다는 급진적인 주장은 아무래도 현실성이 결여됩니다. 육식에서 채식으로 식단을 바꾸는 일이 보통 일은 아니니까요. 따라서 인간과 동물의 경계선으로 이성의 유무를 자주 들이대고는 합니다.
데카르트는 동물과 인간의 몸은 유사하지만, 인간만 영혼이 존재한다고 그 차별성을 강조합니다. 바로 생각하는 이성 능력을 꼽은 것이고, 정신과 육체를 분리함으로써 동물의 움직임은 마치 기계 작동과 마찬가지라는 평가를 내립니다.
종의 특수성을 주장하는 입장보다는 제법 논리적 설득력이 있지만, 그렇다고 이를 인간과 동물의 구분선으로 삼기에는 어렵습니다. 식물인간이나 어린아이 보다는 돌고래의 이성 능력이 더 뛰어나다는 사실을 접어두더라도, 과학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인간 이성의 독자성을 급속하게 위협하니까요.
구글의 딥마인드가 개발한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 ‘알파고’는 이미 인간의 바둑계를 평정해 버렸습니다. 인간 세계 최고의 바둑 고수는 결국 눈물을 보이게 됩니다. 항복한 거지요.
영화 ‘바이센테니얼 맨’은 바로 이러한 상황을 설정한 미래 영화인데요, 불량 칩으로 탄생한 로봇 앤드류는 스스로 학습하고 창조하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창작물을 통해 돈을 벌기도 하고, 자신의 실존을 사색하기 위해 설산(雪山) 속을 헤매기도 하다, 결국 주인집 딸과 사랑에 빠져 그녀와 결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지요. 신체 구조는 진화된 기술 덕분에 인간의 모습을 거의 완벽하게 재현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설산속에서 실존을 고민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이제 인간이 자신의 이성을 내세워서 다른 존재와의 차별성을 주장하기 어려운 시대가 점점 다가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 좀더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구분선을 제시하려는 노력도 있는데요, 이것은 오랜 진화의 정점에 서 있는 인간 유전자가 가장 고도화되었다는 시각입니다. 이렇게 고도화된 유전자가 성대 위쪽의 확대된 인두강(咽頭腔)을 통해 다양한 소리를 내보내며, 집단 이성을 이루었다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학적인 사실이라고 해도, 가치의 문제와는 별개입니다. 유전자가 복잡하거나, 특별한 능력을 보유했다고 해서 그것이 존귀하거나 존중받아야한다는 사실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다른 특징일 뿐입니다.
인간은 말하는 능력을 지녔지만, 새는 나는 능력을 맹수는 사냥하는 유전자를 가졌을 뿐입니다. 실상, 하늘을 나는 여객기보다는 한 마리 새의 생체 구조가 훨씬 더 복잡할 것입니다. 새는 못 만드니까요. 그렇다고 새가 비행기보다 존엄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창공에서 새와 충돌하면서 연일 비행기는 이륙합니다.
동물 윤리에 대한 가장 급진적인 논의는 결국 동등설로 향하게 됩니다. 모든 생명의 가치는 동일하고, 다소간의 정도차가 있을 뿐이지 궁극적인 본질의 차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논의를 다소 부담스러운 인간과 동물의 동등설에 좁히겠습니다. 인간을 포함한 특정 종의 개체들은 지구를 빌어 살면서, 이를 살아 갈 뿐, 이는 주인과 나그네를 가를 수 없다는 시각입니다. 특히 이러한 동등설은 인간이 지닌 이성적 능력 등에 주목하기 보다는 인간과 동물이 지닌 유사성에 집중해서 차별화를 차단하는데 주력하는데요, 특히 동물이 느끼는 고통 등에 대한 논의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치킨은, 하루에도 수만마리의 닭이 살아 있는 상태에서 거꾸로 매달려, 일정한 벨트를 지나가면서 기계식 커터칼이 목을 잘라, 바닥에 내려 놓는 과정에 통해 배달됩니다. 그런데 살고자 하는 의욕이 넘치거나 학업 능력이 우수한 일부 닭은 그 와중에 목을 올려서 커터날을 피해 고개를 움추린다고 합니다. 이 닭이 다시 살아 벹트를 타고 돌아왔을 때, 다시 되돌려 보내는 고통이 너무 심해서, 제가 아는 한 분은 그 직업을 그만 두고, 이제는 채식주의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동등설에 깊이 감명받아 내일부터 치킨을 끊는다고 해도, 문제는 남습니다. 내 몸을 파고 드는 모기와 내가 동등한 개체인 만큼 이를 참아야되고, 자동차가 달려오는 도로에 놓인 어린아기와 강아지를 놓고 고민을 거듭하다 모두 잃을 수도 있습니다. 답이 없다는 것, 인문학의 매력입니다. 인문학은 인간의 불완전성에 대한 정답 없는 넋두리입니다.
[저작권자(c) 청원닷컴,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기사 제공자에게 드리는 광고공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