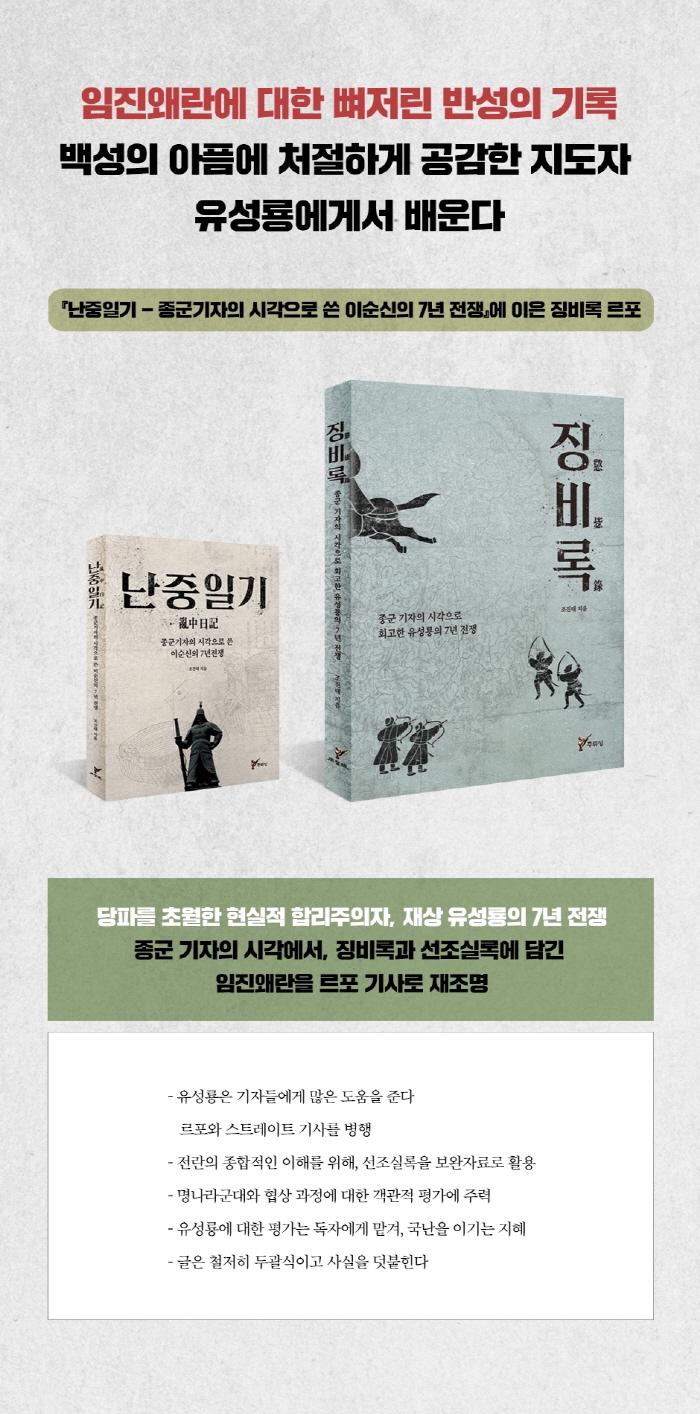자본주의와 벌레, 루저 문화
자본주의와 벌레, 루저 문화
코로나로 일상이 정지되고 특히 자영업자에게는 하루하루가 힘겹습니다.
“왜 일을 하세요?”
“전세 값 올려주고, 애들 키워야지요.”
아주 자연스럽게 들리는 이 대화 속에는 제법 모순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마치 선글라스를 쓰기 위해 눈이 존재한다는 식의 논리입니다. 집과 애들이 자신의 삶에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은 늘 이 생각만으로 머리가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은 불행하게도 자신이 태어나는 시간과 공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일정한 구조와 제약 속에 놓이게 됩니다. 어느 나라, 어떤 도시, 그리고 부모의 사회적 지위 등이 그물망처럼 한 개인을 속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명품 매장에서, 또 다른 이는 다이소에서 만족하는 법을 배우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식당에서 메뉴를 고르면서 자유를 누린다고 착각하지만, 자신의 주머니 사정에 따라 들어가야 하는 식당이 정해져 있다면 본질적인 자유는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는 이를 아비투스(Habitus)라고 이름 붙였지요. 사회적 계급 속에서 형성된 개인의 습관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는 말 그대로 사람이 아니라 자본이 지배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생산성이 최고의 덕목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노동자들은 끊임없이 시간과의 전쟁, 즉 속도전을 치르면서 숨 가쁘게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소유가 당신의 지위를 결정하니까요.

찰리 채플린, '모던타임즈'의 한 장면
JTBC드라마 ‘SKY 케슬’은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드라마에 나오는 주역들은 인생의 ‘SKY'와는 정반대인 저급하고, 저열한 군상들에 불과하지만, 이 드라마에 대한 높은 시청률은 우리 사회가 지닌 가치의 지향점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낙오한 사람들은 소위 루저 문화를 만들어서, 세상을 비웃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해학을 통해 승화하려 하지만, 씁쓸한 웃음으로 그칠 수 밖에 없습니다. 프란츠 카프카는 소설 ‘변신’을 통해 루저 인생에 대한 낭만을 송두리째 깨어 버립니다.
어느 날 아침 그레고르 잠자가 악몽에서 깨어났을 때 자신이 침대 위에서 한 마리의 커다란 벌레로 변해있음을 깨달았다. (중략)아버지는 찬장 위에 있는 과일 접시에서 사과를 집어 주머니에 잔뜩 집어넣더니 처음에는 겨누지도 않고 사과를 연달아 던졌다. 던져진 사과 하나가 그레고르의 등을 스쳤지만 다치지는 않고 빗나갔다. 그러나 다음에 날아온 사과가 그레고르의 등을 제대로 맞히고 말았다. 뜻밖에 받은 심한 고통으로 그는 옴짝달싹 못하고 온 감각이 마비되어 그 자리에 뻗어버렸다. (중략)"어머니! 아버지! 이 이상 더 못 견디겠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직 사정을 잘 모르시지만 저는 알고 있어요. 저는 이런 괴물을 오빠라 부르고 싶지 않아요. 저것을 없애 버려요." (중략)그는 이처럼 허전하고 고요한 명상에 잠겨 있었다. 창밖이 환하게 밝아오기 시작한 것을 그는 짐작할 수 있었다. 그때 그의 머리가 자기도 모르게 밑으로 푹 수그러졌다. 그리고 그의 콧구멍에서는 마지막 숨이 힘없이 새어나왔다. (중략)세 사람이 함께 집을 나섰다. 몇 달 동안이나 이런 일은 없었다. 세 사람은 전차를 타고 교외로 나갔다. 전차 안에는 그들 세 사람뿐이었다. 따뜻한 햇볕이 차안으로 흘러 들어왔다. 그들은 편안하게 좌석에 몸을 기대고 장래 일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 받았다.
줄거리 소개를 위해 다소 길게 인용을 했는데요, 간단하게 줄이면 누군가의 자식이자 오빠가 벌레로 변하자, 가족들이 사과를 집어 던져 죽인 뒤, 묻고 나서 비로소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다는 것입니다. 카프카에 따르면 ‘구조의 낙오자’ 즉, 루저는 누군가가, 심지어 가족이 던지는 사과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루저를 버린 뒤, 평화를 찾는다는 섬뜩한 이야기입니다. 직장을 잃은 아빠에게 정말 준엄한 경고입니다.
이 이야기는 한국 현대 소설에서 이렇게 진화합니다. 김언수의 소설 ‘캐비닛- 토포러’의 한 부분을 보면, 이 벌레가 긴잠을 자는 평화로 바뀌게 됩니다. 이를 작가는 토포러(torporer), 매우 긴 잠을 자는 사람이라고 일컫는데, 대부분 이를 시도하지 못한다고 토로합니다.
“사실 나는 그저 토포의 늪에 한 번쯤 풍덩 빠져 보고 싶다. 회사만 안 잘리고, 월급만 제대로 나오고, 보험금이나 적금 통장에 ‘빵꾸’만 안 나고, 주위 사람들에게 ‘인생을 왜 그딴 식으로 사냐.’라는 식의 잔소리만 안 듣는다면, 모든 것을 잊고 그저 한 육 개월쯤 푹 자고 싶은 심정이다.”
코로나가 잠시 당신을 토포러로 이끈다고 생각해보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박목월님의 시 한수를 올리며 매듭합니다.
산이 날 에워싸고
그믐달처럼 사위어지는 목숨
구름처럼 살아라 한다.
바람처럼 살아라 한다.
[저작권자(c) 청원닷컴,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기사 제공자에게 드리는 광고공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