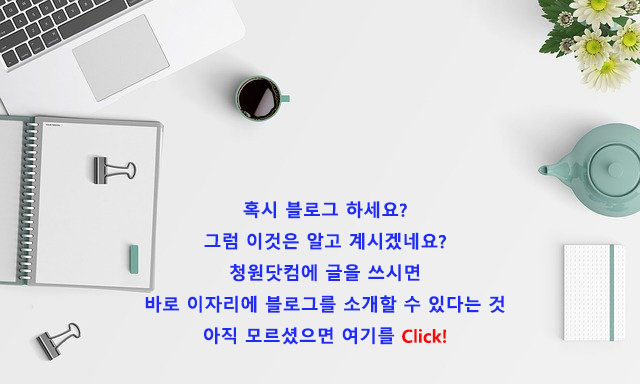[서평] 조진태의 난중일기
처음엔 바빴고 다음엔 잠시 잊었다. 받은지 일년 하고도 한 분기가 더 지나서야 책을 펼쳐 들었다. 참으로 못된 독자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난중일기를 읽었다. 난중일기는 네 권의 고전읽기 대회 지정서 중 하나였다. 상으로 받은 일년치 일기장 한 쪽은 난중일기 일부와 내가 써야할 일기를 위한 공란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내가 난중일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고 항상 생각했던 이유다.
페이지를 거듭하면서 이순신이라는 인간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었음을 알게 됐다. 전쟁을 잘했던 장군, 천재적인 지휘관, 이런 것들은 이순신에 대해 아는 지극히 편협한 일부였음을 실감했다.
삼국지를 읽을 때나,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읽을 때, 등장인물들은 각기 천차만별적인 경영인의 귀감이다. 그동안 이순신을 경영인의 귀감으로 얘기하거나 들은 적은 별반 없었다. 하루나 이틀이라는 비교적 짧은 시간의 전쟁을 치루기 위해 장군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준비해야 했는지, 그 경영의 과정을 이 책은 소상하게 보여준다.
놀랍게도 이 책에는 경영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고 있다. 성벽의 틈을 작은 것 하나까지 꼼꼼히 메우고, 청어를 말리고, 강제부역이 아닌 정당한 거래로 물자와 노동을 확보하고, 부풀려진 장부상의 곡물량을 실제로 다시 계량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 수족의 곤장을 치는 얘기 하나하나는 완벽히 준비된 경영인으로서 이순신 장군의 모습을 새롭게 조명한다. 싸움의 승리가 하루만의 전략적 성과물이 결코 아니었음을 저절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글쓴이는 독자에게 결코 이런 모습을 강요하는 바가 없다. 필체는 덤덤하다. 백성들에 대한 이순신의 애정은 매 쪽마다 묻어나지만, 글쓴이는 ‘백성들에 대한 사랑’이라는 용어조차 사용하지 않는다. 짧고 간결한 문체들은, 만연체의 문장으로 자신의 사고를 독자들에게 들이대는 글들과 사뭇 다른 양상이다. 읽을 수 있으면 읽을 수 있지만, 읽을 수 없으면 읽을 수 없다. 판단과 감정은 철저하게 독자들의 몫이고 글쓴이는 여기에 관여하지 않는다.
명량해전에 이르러 고도로 감정이입이 된다. 기자로서의 글쓴이는 해전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을 뿐이다. 편전과 화살이 날아들고, 낫에 적군의 목이 걸리는 얘기들이다. 역설적이게도 잔인하고 급박한 전투장면 마디 마디 고달프고 서럽디 서러웠던 장군의 삶이 투영된다. 자칫 독자의 가슴이 먹먹해지고 눈시울이 뜨거워질 수도 있다.
하루의 전쟁이 있기까지 겪어야 했던 고초들, 목숨의 크기에는 서로 다를 바가 없는 장군과 백성, 열세척의 배로 적선 군단을 맞아야 하는 두려움, 질 수 있는, 그래서 죽을 수도 있는 싸움을 위한 준비, 열악했던 조건들, 글쓴이가 전투장면에서 말하지 않고 있는 오만가지 것들이 글을 읽는 내내 머릿 속에서 비워지지 않는다.
글쓴이는 기자의 역할을 잘 알고 있다. 다수의 여론을 빙자한 관점의 강요같은 것은 일체 없다. 하나 하나의 문장들은 커다란 통나무를 싹둑 베어내어 다듬고 다듬어 만들어낸 작은 조각물 같은 느낌이 든다. 묘사는 절제되고 문장의 길이는 한 뼘을 넘지 않는다. 하지만 열줄의 길이보다 더 많은 것을 담고 있는 듯하다.
이순신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독자들에게 이 책을 권하고 싶다. 분명 다른 이순신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막 이순신을 알고자 하는 독자에게는 여러 명의 이순신을 한꺼번에 만나는 즐거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조진태 지음/주류성 출판사/368쪽
[저작권자(c) 청원닷컴,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기사 제공자에게 드리는 광고공간]